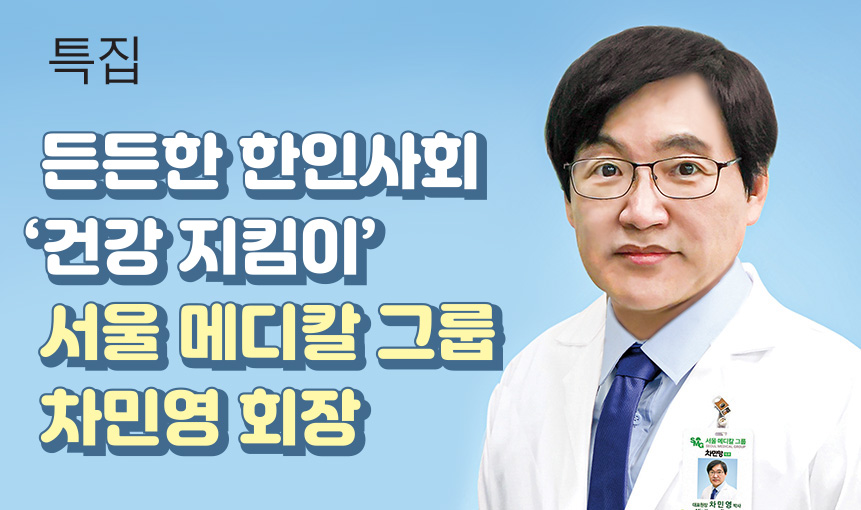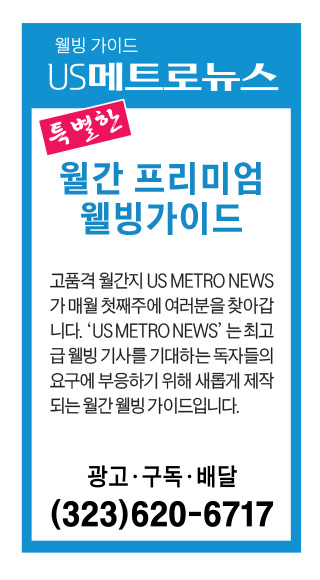‘코비드-19’의 대표적 증상 중 하나가 ‘고열’이다. 체온이 103~104도를 넘으면 감염이 됐다고 봐야 하므로 자가 격리나 치료를 요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사람의 체온은 얼마가 정상이고 또 체온, 즉 열은 우리 몸과 어떤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을 까. 뉴욕 타임스의 제인 브래디 기자가 이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했다.
인간의 정상 체온은‘98.6’도
진화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낮아져
대부분‘고열’은 병균을 물리치는 고마운 존재
병증 완화, 치료 기간 단축에 도움줘
어린이는‘고열’보다 열 상승 속도가 문제

요즘 공공장소에 들어가려면 체온을 잰다. 이마에 스캐너식 체온기를 대면 금방 체온이 표시된다. 한가지 궁금한 점은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또는 무더위 속에서도 체온은 항상 비슷하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체온은 얼마가 정상일까. 대부분의 의사들은 화씨 98.6도를 정상체온으로 본다. 섭씨로는 37도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정상 체온은 이보다 조금 낮은 97.5도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UC) 샌타바바라의 인류학자 마이클 거번, 토마스 크래프트가 공저한 ‘인간의 체온은 정상보다 낮다-볼리비아 아마존에서 조차도’에 기록된 저자들의 대화를 살펴보자.
■ “만유 공통의 단일 ‘정상’체온이란 없다”
체온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아침에는 낮고 저녁에는 높아진다. 운동 중이거나 운동을 마친 후에는 체온이 오르고 생리 때, 또는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다. 보통 나이가 들면 체온이 낮아 진다.
더군다나 과학자들이 캘리포니아 팔로 알토 거주자 수십만명의 체온을 측정한 결과, 인간의 정상 온도는 97.5도다. 이는 1867년 독일의사 칼 분데리히 박사가 2만5,000명을 대상으로 측정한 정상 체온보다 1도 정도 낮은 수치다. 분데리히 박사의 연구 결과, 인간의 정상 체온은 97.2도에서 99.5도 사이였다.
1862년~2017년 데이터에서 스탠포드 의과 대학의 줄리 파세넷 교수는 공동 연구 저서에서 10년마다 정상 체온이 0.05도씩 낮아 진다고 발표했다. 파세넷 교수는 정상 체온의 75%는 98.6도 이하임을 관찰했다.
■ 98.6도 이상이면 ‘고열’ 일까
그렇다면 내 체온이 98.6도 이상이면 열이 난다고 봐야 하냐는 의문이 생긴다. 이에 대해 뉴욕 버팔로 ‘로스엘 파크’암센터의 샤론 에반스 암 및 면역학 교수는 그럴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100.4도라고 해도 크게 높은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에반스 교수는 동료 교수 엘리자베스 레파스키, 다니엘 피셔 교수와의 공동 저서에서 대부분의 경우 열은 인체에 이로움을 주며 심각한 병증을 완화시켜 줌과 동시에 완치 기간을 단축시킨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는 해열제를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반스 교수는 ‘열’은 면역 시스템에서 다양한 ‘무기’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는 온혈 동물, 냉혈 동물 등 모든 동물에 걸쳐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열은 모든 면역 체계를 잘 작동하도록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에반스 교수에 따르면 ‘열’은 내면의 면역을 활성화시킨다. 백혈구의 활동을 증강시킨다. 즉, 병원체를 찾아 인간의 몸 속을 돌아다니는 과립 백혈구를 활성화시키고 대식세포가 병원균을 잡아먹도록 해준다. 대식세포는 몸속에서 즉시 경보를 발령해 T세포와 B 세포를 불러 방어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이들 세포는 침입 병균에 반응하기 시작해 몇일 후 체내에 병원균에 저항하는 항체를 생성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백신학자 펄 오핏 박사는 필라델피아 의대에서 제작하는 유튜브 방송 “히포크라테스가 맞았다: 해열 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다”에서 “열을 (강제적으로) 낮추면 병증을 더 악화시키고 병증도 더 길게 만들 수 있다”고 선언했다.
오핏 박사는 “열은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고했다. 따라서 타이네롤 등에 포함된 해열 성분 ‘아세타미노펜’또는 ‘이버프로펜’과 같은 해열제를 먹으면 자연이 부여한, 타고난 방어 혜택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결론이다.
오핏 박사는 열이 낮아 지면 분명 두통이나 근육통, 피로감 등의 증상이 누그러지고 기분도 좋아진다면서도 “기분이 좋아질 것이 아니라 몸을 따듯하게 하고 감염을 막아야 한다. 밖으로 나돌지 말고 남들에게 전염시키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열이 나는 이유가 있다”면서 “바이러스의 번식을 줄여주고 독감 같은 병증의 앓는 기간을 짧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 열은 바이러스 번식 억제 - 고열보다 상승 속도에 주목
닭 스프는 감기 걸렸을 때 효험 있는 민간 요법으로 잘 알려 져 있는데 이유는 있다. 따듯한 김이 비강(콧구멍)의 온도를 올려 주면서 바이러스의 번식을 억제한다.
에반스 박사 등은 “척추 동물의 진화를 통해 열병의 ‘열’은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뒷받침해 준다”고 기록했다. 이는 곤충 같은 무척추 동물에서도 해당된다. 또 도마뱀 또는 벌과 같은 냉혈 동물도 몸이 아프면 신체 활동을 늘리거나 따듯한 환경을 찾아 체온을 올리려고 한다.
그런데 왜 인간은 열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쓸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라고 브룩클린의 소아과 의사 고든 박사는 말한다. 한밤중에도 자녀들의 열이 오르면 부모들이 전화를 걸곤 한다.
그녀는 밤에 아이들의 고열이 예상되면 부모들에게 미리 알려 주고 감염으로 인한 고열 자체는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설명해 줄 것을 권하고 있다.
그녀는 “사람의 몸은 고열로 인해 몸을 해치지 못하도록 온도를 조절해주는, 시상 하부라는 자동 온도조절 장치를 가지고 있다”면서 “어린이들에게 발생하는 잠시간의 경련, 의식을 잃는 등의 열에 의한 발작은 고열 상태 유지가 아니라 열의 상승 속도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전적으로 민감한 어린이들은 99도에서 100.8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빠르게 올라가면 발작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고든 박사는 “열발작은 이를 지켜보는 부모 입장에서 매우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지만 어떤 해도 끼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면역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은, 그리고 전염병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아기들의 고열은 주의해야 한다고 그는 주의를 환시 시켰다.
그렇다고 열이 올라도 무방비로 놔두라는 것은 아니다.
고든 박사는 “열이 체내 감염균과 싸우는 효과가 있다고 해도 어린이, 특히 비언어기의 어린이들은 열로 인해 잠을 자지 못하거나 먹지 못한다면 해열제를 처방해 열을 내리도록 한다”고 밝혔다.
성인들도 체온이 103도 이상으로 치솟는다면 의학적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
열에 대한 주의할 점도 있다. 감염에 의해 체온이 증가하는 경우가 아니라 주변 환경에 의해, 다시말해 한 낮 차안에 아이들이 방치된다거나 더운날 운동을 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사병에 걸려 위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체온은 어느 신체 부분을 측정하는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귀는 구강 온도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며 구강은 겨드랑이 또는 이마 온도 측정 보다도 더 높다.
신생아는 항문 온도 측정이 가장 정확하지만 성장한 아이들의 체온은 백신 접종을 했다면 그다지 큰 의미는 없다고 고든 소아과 전문의는 설명했다.
Comment 0
|
일자: 2021.05.25 / 조회수: 5786 ‘코비드-19’의 대표적 증상 중 하나가 ‘고열’이다. 체온이 103~104도를 넘으면 감염이 됐다고 봐야 하므로 자가 격리나 치료를 요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사람의 체온은 얼마가 정상이고 또 체온, 즉 열은 우리 몸과 어떤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을 까.... |